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님과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님을 찾아뵙고
마눌님과 귀갓길에 시간을 내어 오랜만에 종묘도 찾아보고
지난해 6월 창경궁을 찾았을 때 빠트린 곳을 찾았는데
종로3가역 11번출입구에서 종묘로 진행을 했다.

서울시는 1995년 서울 정도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종묘공원(宗廟公園)에 정도전의 부조와 더불어
진신도팔경시(進新都八景詩)를 새긴 시비(詩碑)를 세웠다.
進新都八景詩(진신도팔경시)는 ‘새 수도(한양)의 여덟 곳의 빼어난
경치를 읊은 시를 드리다’라는 뜻으로,
고려 말 조선 초의 정치가이자 학자이면서,
조선 개국의 일등공신인 삼봉(三峰) 장도전(鄭道傳)의 문집
삼봉집(三峰集) 제1권에 실린 6언 4구, 8수로 된 연시의 한시다.
8수의 시를 내용별로 요약하면, 한양의 지세, 성곽과 궁궐,
문물제도의 완비, 시가지의 모습, 군대의 위용, 풍부한 물자,
번화한 한양, 평화로운 정경 등을 차례대로 노래하여,
신도읍지 한양이 수도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고 있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다.

進新都八景詩(진신도팔경시)
畿甸山河(기전산하)
沃饒畿甸千里(옥요기전천리)
表裏山河百二(표리산하백이)
德敎得兼形勢(덕교득겸형세)
歷年可卜千紀(역년가복천기)
都城宮苑(도성궁원)
城高鐵甕千尋(성고철옹천심)
雲繞蓬萊五色(운요봉래오색)
年年上苑鶯花(연년상원앵화)
歲歲都人遊樂(세세도인유락)
列署星拱(열서성공)
列署岧嶤相向(열서초요상향)
有如星拱北辰(유여성공북진)
月曉官街如水(월요관가여수)
鳴珂不動纖塵(명가부동섬진)
諸坊碁布(제방기포)
第宅凌雲屹立(제택능운흘립)
閭閻撲地相連(여염박지상연)
朝朝暮暮煙火(조조모모연화)
一代繁華晏然(일대번화안연)
東門敎場(동문교장)
鐘鼓轟轟動地(종고굉굉동지)
旌旗旆旆連空(정기패패연공)
萬馬周旋如一(만마주선여일)
驅之可以卽戎(구지가이즉융)
西江漕泊(서강조박)
四方輻湊西江(사방복주서강)
拖以龍驤萬斛(타이용양만곡)
請看紅腐千倉(청간홍부천창)
爲政在於足食(위정재어족식)
南渡行人(남도행인)
南渡之水滔滔(남도지수도도)
行人四至鑣鑣(행인사지표표)
老者休少者負(노자휴소자부)
謳歌前後相酬(구가전후상수)
北郊牧馬(북교목마)
瞻彼北郊如砥(첨피북교여지)
春來草茂泉甘(춘래초무감천)
萬馬雲屯鵲厲(만마운둔작려)
牧人隨意西南(목인수의서남)

종묘 어정(宗廟 御井)은 1983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이 종묘에 왕래할 때
이 우물의 물을 마셨다고 하여 '어정'이라고 부르며,
서울 4대문에 남아 있는 유일한 우물이다.
원형으로 깊이는 약 8m, 지름은 약 1.5m이다.
석축의 방법과 석재의 닳은 정도로 보아
조선 초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재(李商在, 1850.10 .26~1927. 3.29)는 충청남도 서천군 출신으로
대한제국 의정부 총무국장 직책을 지낸 정치가이다.
조선후기, 대한제국의 정치인으로 개화파 운동가였으며,
일제강점기 조선 시대의 교육자, 청년운동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 언론인이다.
자는 계호(季皓), 아호는 월남(月南)이다.
본관은 한산이다.

종묘(宗廟)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역대의 왕과 왕비 및 추존(追尊)된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신 왕가의 사당으로
1963년 1월 18일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종묘의 정전에는 19실(室)에 19위의 왕과 30위의 왕후 신주를 모셨으며,
영녕전에는 정전에서 조천된 15위의 왕과 17위의 왕후 및
의민황태자(懿愍皇太子)의 신주를 모셨다.
신주의 봉안 순서는 정전의 경우 서쪽을 상(上)으로 하고
제1실에 태조가 봉안되어 있고, 영
녕전에는 추존조(追尊祖)인 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를 정중(正中)에 모시고
정전과 마찬가지로 서쪽을 상으로 하여 차례대로 모셨다.
이를 소목제도(昭穆制度)라고 한다.
1995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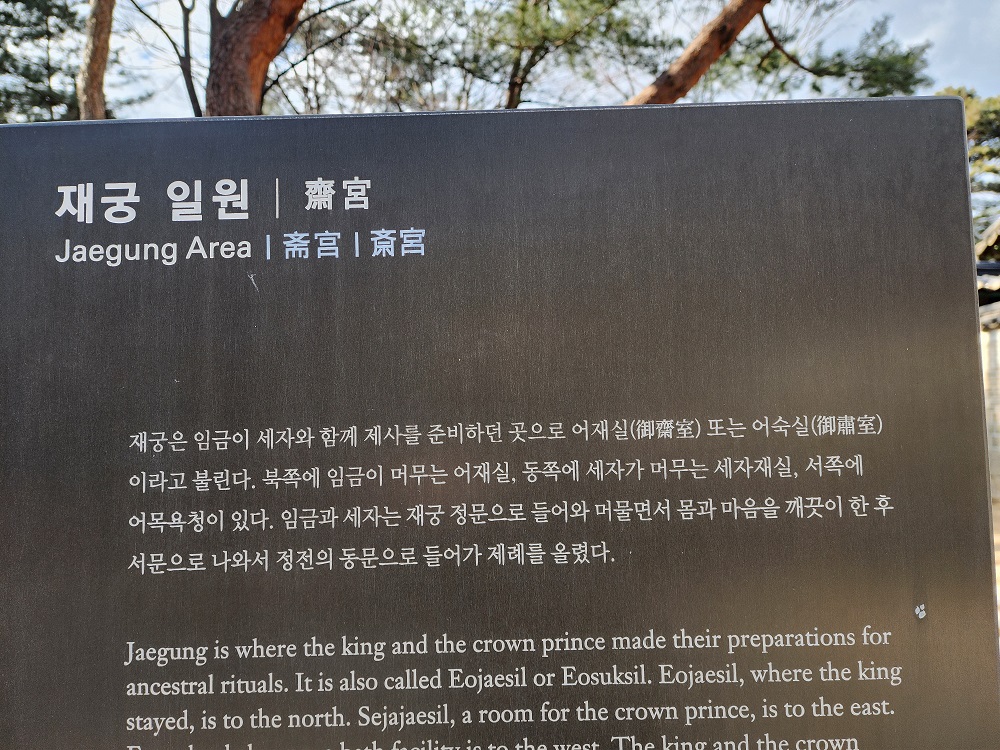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매년 5월과 11월에 거행하고 있으며
2001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고,
200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종묘 정전(宗廟 正殿)..





종묘 정전(宗廟 正殿)은 1985년 1월 8일 국보 제227호로 지정되었다.
종묘는 조선 역대 국왕과 그 비(妃)의 신위(神位)를 모신 곳이며,
정전은 종묘의 중심 건물로 영녕전과 구분하여
태묘(太廟)라 부르기도 한다.




종묘 영녕전(宗廟 永寧殿)..


종묘 영녕전(宗廟 永寧殿)은 조선 태조의 선대 4조 및
종묘의 정전(正殿:太廟)에 봉안되지 않은 조선 역대왕과
그 비(妃)의 신위(神位)를 모셨다.
1421년(세종 3)에 건립되어 그 해 12월 목조(穆祖)의 신주가
제1실에 옮겨진 이래 170여 년을 내려오다가
임진왜란 때 정전과 함께 소실되어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중건되었다.
67년(현종 8)에 다시 중건되었으며,
1836년과 70년에 각각 개수되었다.
1985년 1월 8일 보물 제821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에서는 국왕이 승하하면 종묘 정전에 모시었다가
5세의 원조(遠祖)가 되었을 때 영녕전으로 옮기어 모시게 되어,
영녕전을 천묘(遷廟)한다는 뜻의 조묘(祖廟)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지금 이곳에는 태조 선대의 4조(祖)인 목조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를 비롯하여 정종(定宗)
문종(文宗) 단종(端宗) 기타 추존된 왕과 왕비 등
32위의 위패를 15실에 봉안하고 있다.

종묘에서 북신문(北神門)을 지나서 창경궁으로~

종묘에서 바라본 북악산과 북한산..

설 명절 기간동안 주요 국가유산(고궁, 박물관, 문화재) 및
미술관을 무료 개방한다.

2024년 6월 7일 창경궁을 찾았을 때 빠트린 곳이 있어서
창경궁을 다시 찾았다.

산사나무는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의 낙엽활엽 소교목으로
열매를 산사자(山査子)라고도 하는데 식용 및 약용으로 활용된다.
산사나무는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을 선호하며
음지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다.
나무의 높이는 3~6m이며 나무의 껍질은 잿빛이고 가지에 가시가 있다.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에 가까우 며 이 6~8cm, 폭 5~6cm 이다.
가장자리가 깃처럼 갈라지고 밑부분은 더욱 깊게 갈라진다.
양면 맥 위에 털이 나고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 길이는 2~6cm이다.
산사나무 꽃은 5월에 흰색으로 피고 산방꽃차례에 달린다.
꽃잎은 둥글며 꽃받침과 더불어 5개씩 있다.
수술은 20개, 암술대는 3~5개, 꽃밥은 붉은색이다.
열매는 사과 모양을 띠고 이과(梨果)로 둥글고 흰 반점이 있다.
지름 약 1.5cm이고 9~10월에 붉은빛으로 익으며
개당 3~5개의 종자가 함유되어 있다.

산사나무(山査子)는 열매가 사과맛이 날 뿐더러 사과처럼 붉어서
산에서 나는 사과나무라 하여 산사나무가 되었다.
산사나무 열매는 떡 화채 주스 차 담근술을 만드는데 쓰이고
한방에서 소화촉진 심혈관 간장 면역 향균 등에 사용한다.

창경궁 관천대(昌慶宮 觀天臺)..

창경궁 관천대(昌慶宮 觀天臺)는 보물 제851호이며
숙종 때 만들어진 별자리 관측대로
창경궁 뒷편 언덕에 설치된 석대(石臺)다.



주목(朱木)은 겉씨식물 구과식물아강 주목목 주목과의 상록교목..


창경궁(昌慶宮)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조선의 궁궐이다.
창덕궁의 동쪽에 위치한 궁궐로, 원래는 왕실의 작은 별궁이었던
수강궁(壽康宮)이 있었던 곳이었으나 1483년(성종 14) 성종이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 안순왕후(安順王后) 한씨,
소혜왕후(昭惠王后) 한씨를 모시기 위해 수강궁을 확장하여 건립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이곳에 동물원과 식물원이 들어서게 되면서
창경원(昌慶苑)으로 격하되었고,
1980년대부터 창경궁 복원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궁궐의 명칭인 '창경(昌: 창성할 창, 慶: 경사 경)'은
'창성하고 경사스럽다'는 뜻이다.

창경궁 함인정(昌慶宮 涵仁亭)부터는 2024년 6월 7일에
찾아보았던 곳이라서 진행하지 않았다.

창경궁 숭문당(昌慶宮 崇文堂)은 창경궁 명정전(明政殿)
서쪽에 있는 전각이다.
임금의 집무실인 편전(便殿)으로 사용된 건물로
임금이 평상시에 머물면서 정사를 펼치던 곳이었다.
정전의 이름인 '숭문(崇: 높일 숭, 文: 글월 문)'은
'학문을 숭상한다'라는 뜻이고,
현판의 글씨는 영조가 직접 쓴 어필이다.


창경궁 빈양문(昌慶宮 賓陽門)은 창경궁 명정전의 후문이다.
그리고 단순한 정전의 후문 기능을 넘어 창경궁 내
합문(閤門) 역할을 했다.
합문이란 궁궐에서 행사 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로 설정된 문을 말한다.
빈양문(賓陽門)은 밝음을 공경하며 맞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천랑(穿廊)은 명정전 뒤편에서 빈양문을 잇는데 건물의 앞뒤 중앙에서
연결하는 구조물로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만 있는 형태이다.
현재 창경궁 명정전과 창덕궁 선정전에 천랑이 남아 있다.


창경궁 명정전(昌慶宮 明政殿)은 국보 제226호..

창경궁 명정전(昌慶宮 明政殿)은 창경궁의 정전(正殿)으로,
외국 사신을 맞이하거나 국가의 큰 행사를 치루던 장소이다.
전각의 명칭인 '명정(明政)'은 '정사를 밝히다.'라는 뜻으로.
조선 전기 문신 서거정이 지었다.
1616년(광해군 8)에 지어진 전각으로,
현존하는 조선시대 궁궐의 정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이며,
조선 5대 궁궐의 정전 중에서 유일하게 남향이 아닌
동향으로 지어졌다.

2024년 6월 7일에는 창경궁 홍화문(昌慶宮 弘化門)에서
명정전으로 진행을 했다.

성종태실(成宗胎室)을 바라보는데 5년 전 2020년 4월 16일
보문산에서 만인산으로 연계산행을 하면서 찾았던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태(胎)를 안치한
태조대왕 태실(太祖大王胎室)이 문득 떠올랐고
산행 속도가 빨랐는데도 산행 거리가 25.23km나 되어서
산행 시간이 9시간 37분 소요되었고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태실(胎室)은 옛날 왕가의 출산이 있을 때 그 출생 아의 태(胎)를 봉안하고
표석을 세운 곳으로 태봉(胎封)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태실도감(胎室都監)을 임시로 설치하여
이 일을 맡게 하였다.
출산 후, 태는 깨끗이 씻은 후 항아리에 봉안하고
기름종이와 파란 명주 봉했다.
예로부터 태는 태아의 생명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인정,
태아가 출산한 뒤에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보관하였다.
특히 왕실인 경우에는 국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믿어서
더욱 소중하게 관리하였다.
태실은 일반적으로 태웅이라는 항아리에 안치하는 것이 통례이나
왕세자나 왕세손 등 다음 보위를 이어 받을 사람의 태는
태봉으로 석실을 만들어 보관하였다.
태를 태실까지 봉송하는 절차와 봉인하는 의식도 까다롭다.
왕자나 공주, 옹주가 태어나면 태를 봉안할 장소를
관상감(觀象監)에서 물색을 하고
봉송 및 개기(開基), 봉토(封土) 등의 날을 가려 정하였다.
태실의 역사를 마치면 토지신에게 보호를 제례를 치렀고
금표를 세워 채석, 벌목, 개간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 시켰다.
우리나라에서 태실이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 성주군
월향면 인촌리에 있는 서진산(棲鎭山)으로
조선 왕실 13위의 태실이 있어 세칭 태봉이라 한다.

창경궁 춘당지(昌慶宮 春塘池)..


창경궁 팔각칠층석탑(昌慶宮 八角七層石塔)은 창경궁 춘당지 인근에 위치한
15세기의 중국식 칠층석탑이다.
탑의 탑신부에 “大明成化六年 庚寅歲秋七月 上澣吉日造(대명성화육년
경인세추 칠월상한길일조)”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1470년(명나라 성화 6)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탑이 어떻게 창경궁에 세워지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제가 창경궁에 이왕가 박물관을 만들 당시 만주의 상인으로부터
이를 매입하여 세운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창경궁 팔각칠층석탑(昌慶宮 八角七層石塔)은
한국에 있는 유일한 중국 석탑으로 보존 가치가 있으며,
1992년 1월 15일 보물 제1119호로 지정되었다.


창경궁 대온실(昌慶宮 大溫室)은 1909년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서양식 온실로, 철골과 유리, 목재 등이 혼합된 건축물이다.
1909년(순종 3) 일제는 순종을 창덕궁에 유폐시킨 뒤
왕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창경궁 내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설치하였는데, 창경궁 대온실도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서양식 온실로, 일본 황실 식물원 책임자였던
후쿠와 하야토가 설계하고 프랑스 회사에서 시공하였으며
당시 조선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식물들이 전시되었다.
6.25전쟁을 겪으면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이후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4년 2월 6일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동백나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등의 따뜻한 지방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남쪽 해안이나 섬에서 자란다.
동백나무 꽃은 봄 가을 겨울에 피는데 피는 시기에 따라
춘백(春栢) 추백(秋栢) 동백(冬栢)으로 부른다.

아름다운 동백꽃을 바라볼 때면 남쪽 여행 생각이 나는데
창경궁 대온실에 있는 붉은색 꽃은 동백(冬栢)나무 꽃~

금감(金柑)은 중국이 원산인 운향과 상록활엽의 관목이자 그 열매를 뜻한다.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설 직전에 집 앞에 금감나무를 심으면
행운과 번영을 불러온다고 믿었다.
관상용으로 보급되었으나 현재는 열매를 식용할 목적으로도 재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귤(金橘)이라고도 부르며,
일본에서는 낑깡(金柑)이라고 한다.
제주도와 같은 남부지방에서 과수로 심는다.

금감에는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부 개선, 피로 해소,
감기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
특히 금감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많은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으며,
갈락탄과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 기침과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창경궁 대온실을 나와서 종로3가역으로 원점회귀~

창경궁 백송(昌慶宮 白松)을 바라보는데 2년 전 2023년 11월
예산 여행을 하면서 찾았던 천연기념물 제106호
예산 용궁리 백송(禮山 龍宮里 白松) 생각이~

종묘와 창경궁을 나와서 귀가하는 중에
6촌 형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으로..

하늘 / 최윤서
하루의 끝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하늘을 본다
보라색, 분홍색, 하늘색이 서로 모여
아름다운 하늘을 만들어 낸다
두둥실 조금씩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
내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
다음날, 그 다음날도
하늘을 내 눈에 담고 싶다
마눌님과 함께 오랜만에 종묘를 찾아보고 지난해 6월에 찾았던
창경궁을 찾았는데 축복이라도 하듯 날씨가 봄날 같았고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도 무척 아름다워 보였고
잠시나마 근심을 잊었던 종묘 창경궁 여행~
'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선유도(2025.3.23)이제 막 피기 시작한 야생화도 보았고 힐링했던~ (0) | 2025.03.24 |
|---|---|
| 애기봉평화생태공원(2024.12.14)장모님을 모시고 마눌님과 함께 찾았는데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3) | 2024.12.18 |
| 충남 부여군 여행(2024.11.22)궁남지 (1) | 2024.12.08 |
| 충남 부여군 여행(2024.11.22)부여 왕릉원 (1) | 2024.12.08 |
| 충남 부여군 여행(2024.11.22)부여박물관 (0) | 2024.12.08 |